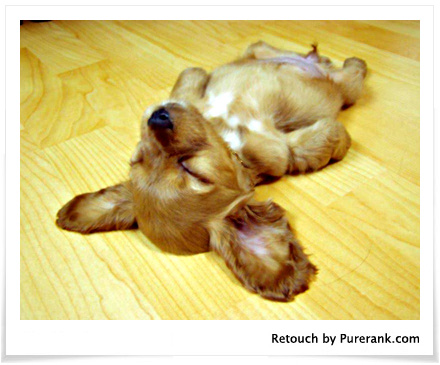
(비가 오네요... 좋은 밤, 좋은 주말 되시길요...)
중학교 2학년쯤으로 기억된다.
발악질로 고군분투 할 때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나를 보고 또래 몇은 피도 눈물도 없는 가시나라며
철면피라고 단정 짓기도 했다. 그런 별명이 싫지 않았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훈장(?)이었으니까.
하지만 속으론 늘 눈물 콧물 투성으로 지낼 때였다.
난 달리기가 싫었다. 숨이 차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통증이 고통스러웠다. 체력장을 할 때 100m 달리기와
오래달리기를 할라치면 뛰기도 전부터 두근거리는 심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당하기가 버거울 정도였다.
몸이 불편한 아이들은 뛰지 않아도 된다는 선생님의 배려가
있었지만 난 포기한 적이 없었다.
전교생이 지켜보는 곳에서 속력을 내지 못하는 것이 쪽팔렸지만
포기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나를 격려했었다.
그것이 엄마의 바람이기도 했으니까.
의리 있는 친구들은 내가 홀로 뒤처지게 놔준 적이 없었다.
그러지 말라고 성깔을 부려도 나와 속도를 맞춰주곤 했다.
그런 일이 있은 날이면 친구들의 희생과 상관없이 내 자존심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서 진흙땅을 뒹굴곤 했다.
완만한 언덕을 이룬 등을 감추기 위해 늘 박스티를 입거나 점퍼나
조끼로 맵시를 내며 허리를 들어내지 못하는 나와 또래의 쫄티 입은
매끈한 모습을 늘 비교하곤 했다.
잘났다고 나대는 것들은 적으로 비췄고 쌈박질도 무진장 했었다.
동변상련의 아픔을 지닌 친구들과는 대놓고 잘 지냈다. 사명감이라도
지닌 듯이.
초등학교 1학년 다닐 쯤 전기장판에 불이 붙어서 전신에 화상을
입은 탓에 2년 휴학하고 나와 한 학년으로 있던 미자(가명)는 점심때마다
홀로 밥을 먹곤 했다. 한반이 된 이상 함께 밥을 먹자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오히려 꺼리곤 했다. 자신과 밥을 먹으면 밥맛이 떨어질
거라며. 그 친구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 두 개만 남은 손가락 위에
잘려나간 손가락이 들려 붙어있는 손을 아무렇지도 않게 덥석 잡았을 때
형제가 사라진 얼굴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콧구멍 두 개와 다물어지지
않는 입 그리고 작은 눈, 그 눈에 가득 고이는 눈물을 보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었다.
“넌, 어쩜 이렇게 손이 부드럽니? 아기 피부 같다...”
그 아이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없다는 애들을 등지고 홀로 도시락을
들고 갔던 날... 감동스런 드라마의 줄거리처럼 그 후로 아이들이
줄줄이 따라붙어 요란한 점심시간을 함께 보낼 수도 있었다.
그 아이에게 말했었다.
“나도 장애가 있어. 그래도 사람이야. 기죽을 것 뭐있니?
네가 주눅 들어 지내면 더 무시당해. 그러지 말자.“
그 말은 내게도 해당되는 당부이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관심 받고 지내면서도 난 늘 외로웠다. 그들과 다른 나를 계속
비교하고 견주곤 했다. 나 역시 거부감이 들기도 했던 맘을
동지애로 눌러 버릴 수 있었다. 그것도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또 다른 친구가 있었다. 선천적으로 척추장애를 지니고 태어나
심하게 몸이 굽었고 키도 작은 친구... 재현(실명)이...
같은 반이 된 적이 없던 애였지만 만나면 반가운 친구로 아는 체를
하고 지냈다.
재현이는 공부를 잘했다. 나보다 더 많은 친구들 속에서 웃고 있던
그 아이였다.
걷는 것조차 숨차 보이던... 눈이 맑은 친구였다.
어느 아침 조회시간에 운동장에 나가지 않고 땡땡이 치고 숨어 있다가
주번이라 나가지 않았다는 그 아이와 만나서 수다를 떤 적이 있었다.
난 그 애보다 여러모로 양호한 몸을 소유했지만 그럼에도 너무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분발이 필요하다며 더한 자극으로 내 스스로를 채찍질 하곤
했는데 우습게도 그 아이가 내게 던진 말이,
“난 네가 제일로 부럽다.” 였다.
“!...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왜 나니?”
정말 궁금했다. 건강하게 이쁜 아이들도 많은데 왜 날까 싶어서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네 자신감과 인기, 의리 있는 친구들, 몸도 표가 잘 안 나는 걸. 네 동생과
친하게 지내는 것도 부럽고... 널 보면 늘 부러웠어. 닮고 싶어서...“
“...... 난 너처럼 차분한 성격이 부럽다. 공부도 잘하잖니. 친구도 많고...”
“그것 말고는 없잖아... 그리고 난 보통들 잘 지낼 뿐이지 너처럼 친한 애들은
없어...”
내가 뭐라고 덧붙여서 말해도 그 아이는 슬픈 얼굴인 체였다.
만나면 누구보다 반갑게 지냈던 친구였지만 졸업해서까지 연락하는
사이는 되지 못했던 친구들을 아빈이가 4살이 되기 전에 친정 내려갔을 때
우연히 길에서 따로 만난 적이 있었다.
미자를 먼저 만났던 것 같다. 반가운 마음에 커피 솝까지 들러서 잠시
수다를 떨었는데 그 아인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했다. 당시에도 많은
수술을 했던 친구가 졸업해서도 더한 수술을 받았었다고... 얼굴도 이목구비가
좀은 더 뚜렷해져 있었고 붙어있던 손가락도 분리되어 있었다. 내 힘겨움을
눈치체지 못한 미자가 내게 좋아 보인다고 했다. 아빈이도 어쩜 그리 예쁘게
생겼냐며... 연락처를 주고받았지만 이어가질 못했다. 미니스커트에 부츠로
멋을 내고 다니는, 자신감을 많이 찾은 듯한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그리고 재현이... 언젠가 버스에서 만났다.
어쩜 그렇게 변한 것이 없는지, 그 아이만 시간이 비껴간 것만
같았다. 결혼 해야지? 웃으며 말한 내게 하나님과 결혼을 했다고 했던 친구...
그 후 몇 해 지나지 않아서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동창의 연락을
받았었다. 그날 참 많이도 울었다.
그 아이에게 있어서 내 모든 것은 부러운 삶이었다고 했다.
결혼, 남편, 자식들... 그들과 싸워가며 보대끼며 사는 것도
그 아이가 살아있으면 부러워했을 삶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 아이들을 무시하면 곧 나를 무시하는 것만 같아서 발끈했었다.
왠지 그랬다. 내게 당시에 그 아이들은 바로 나였다.
나와 그 아이들이 갖은 아픔이 똑같은 거라고 여겨졌다.
그 아이들이 위축 되어 있는 것도 싫고 기죽은 것도 싫었다.
당당하자고 했다.
내가... 몸이 완전한 비장애인이었다면 더 자만한 인간으로 있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능력 있는 남자와 살았다면 더 경솔한 인간이었을지도 모른다.
지금... 내가 아직도 겸손과 먼 인간임에는 틀림없겠지만... 이만큼
남의 일을 방관하지 못하게 된 것이 내 결점들 때문이 아닐까, 하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가 무시당하는 것이 보이면 화가 난다.
잘난 것도 없는 이가 우월감에 빠져서 우쭐하는 것을 봐도 화가 난다.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을 보듬을 줄 모른 것을 봐도 화가 난다.
이것도 병임을 알겠는데... 고쳐지지 못할 고질병... 이런 맘보때문에
나는 더 힘겹다.